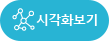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8401322 |
|---|---|
| 한자 | 墨坊十詠 |
| 영어공식명칭 | Mukbangsibyeong |
| 분야 | 구비 전승·언어·문학/문학 |
| 유형 | 작품/문학 작품 |
| 지역 |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|
| 시대 | 근대/개항기 |
| 집필자 | 조유영 |
| 저자 생년 시기/일시 | 1815년 - 장복추 출생 |
|---|---|
| 저자 몰년 시기/일시 | 1900년 - 장복추 사망 |
| 배경 지역 | 묵방서당 -
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
|
| 성격 | 한시 |
| 작가 | 장복추 |
[정의]
개항기 장복추가 성주 지역에 머물며 지은 칠언 절구의 연작 한시.
[개설]
사미헌(四未軒) 장복추(張福樞)[1815~1900]의 문집인 『사미헌집(四未軒集)』 권1에 실려 있다. 장복추가 1892년(고종 29) 78세 되던 해에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묵방서당(墨坊書堂)을 경영하면서 주변의 승경을 대상으로 노래한 칠언 절구 10수의 한시 작품이다.
[구성]
「묵방십영(墨坊十詠)」은 「멱진탄(覔眞灘)」, 「수등간(垂藤澗)」, 「쌍류추(雙流湫)」, 「세심연(洗心淵)」, 「반타석(盤陀石)」, 「현운대(玄雲臺)」, 「필암(筆巖)」, 「연반(硯磐)」, 「고폭(鼓瀑)」, 「평천(平川)」 10수의 칠언 절구로 구성되어 있다.
[내용]
장복추가 만년에 강학하던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묵방서당 주변의 승경을 노래한 작품이다. 「묵방십영」 중에서 「세심연」을 살펴보면 마음을 씻는 못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리학의 수양론이 깊이 내재해 있음을 볼 수 있다. 「세심연」의 전반부에서는 연못의 맑은 물로 마음을 씻어 나를 성찰한다고 하였고, 후반부에서는 상수리나무가 찬물의 맑은 본성을 알아 그늘을 만들어 보호한다고 하였다. 이러한 시상은 성리학자로서 주변 사물을 관찰하면서 이를 시로 형상화하고자 한 장복추의 시작 경향을 보여 주는 예이다.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끝이 없는 맑은 연못 티끌 낀 마음을 씻어내고/ 여기에 이른 나로 하여금 깊이 성찰하게 하네/ 상수리나무는 능히 찬물의 맑은 본성을 알아/ 짐짓 봄과 여름에 높은 그늘을 드리우네[淵淸無底洗塵心 到此令人發省深 棫樸能知寒水性 故敎春夏覆高陰]
[특징]
「묵방십영」은 장복추가 만년에 은거하던 묵방 주변의 승경 10곳을 지정해서 노래한 집경시이다. 하지만 전체 10수로 이루어진 연작시의 형태와 작품들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시어와 시상을 살펴보면 주자(朱子)의 「무이도가(武夷櫂歌)」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특히 마지막 열 번째 작품인 「평천」은 「무이도가」의 마지막 수의 시상을 그대로 가져와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.
[의의와 평가]
「묵방십영」은 묵방서당 주변의 승경 10곳을 집약적으로 노래한 집경시이긴 하나,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자의 「무이도가」와 구곡시(九曲詩)의 영향 속에서 창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. 또한 조선 후기 성리학자의 산수 인식과 그 문학적 형상화 방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.
- 『사미헌집(四未軒集)』
- 정우락, 「장복추 문학의 사상적 기저와 그 작품의 경향」(『어문론총』45, 한국문학언어학회, 2006)
- 황위주, 「사미헌 장복추의 한시 세계」(『어문론총』47, 한국문학언어학회, 200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