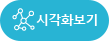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8400597 |
|---|---|
| 한자 | 裵克明 |
| 영어공식명칭 | Bae Geukmyeong |
| 이칭/별칭 | 미은(薇隱) |
| 분야 | 역사/전통 시대,성씨·인물/전통 시대 인물 |
| 유형 | 인물/문무 관인 |
| 지역 | 경상북도 성주군 |
| 시대 | 고려/고려 후기,조선/조선 전기 |
| 집필자 | 진갑곤 |
| 거주|이주지 | 배극명 은거지 -
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
|
|---|---|
| 성격 | 무신 |
| 성별 | 남 |
| 본관 | 성산 |
| 대표 관직|경력 | 도총제(都摠制) |
[정의]
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 성주 출신의 무신.
[가계]
본관은 성산(星山). 호는 미은(薇隱). 흥안군(興安君) 배인경(裵仁慶)의 후손이다. 증조할아버지는 장시(掌侍) 배격(裵格)이고, 할아버지는 배손신(裵遜伸)이다. 아버지는 소부 소윤(少府少尹) 배희보(裵希輔)이다.
[활동 사항]
배극명(裵克明)은 고려 말에 무과(武科)에 급제하여, 벼슬이 도총제(都摠制)에 이르렀다. 이성계(李成桂)[1335~1408]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왕위에 등극하자 절의를 지켜 성주읍 예산리 고향 마을 도덕골[道德洞]로 돌아가 은거하였다. 이에 태조(太祖)가 배극명을 지난 왕조의 명신(名臣)이라 하여 등용하고자 세 차례나 패초(牌招)하여 불렀으나 나오지 않자 화를 내며 “충절은 전고에 비할 데가 없으나 따르지 않으니 품계를 내려서 제수하라”고 명하였다. 승지(承旨)가 왕명을 받고 신하를 부를 때 가져가는 목패(木牌)인 패초를 받은 신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지정된 시간까지 입시하지 않으면 중벌에 처해지는 엄격한 법률이 있음에도 배극명이 불사이군(不事二君)의 절의를 지키니 왕이 칭송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적인 화를 낸 것이다.
미은(薇隱)이라는 호가 암시하듯이 그 옛날 백이(伯夷)와 숙제(叔齊)가 수양산(首陽山)에 은둔하며 고사리를 뜯어 먹으며 채미가(采薇歌)를 부른 것처럼 배극명도 “옛 사람 그리워하여 탄식을 일으키니/ 산에 고사리 있어 캘 수 있다네[懷古人而興吁 山有薇而可採].”라고 노래하였다.
한편 『경산지(京山志)』와 배씨세적(裵氏世蹟)에 의하면, 성주 예동 마을은 당초 사례동(沙禮洞)이라 불리다가 와전되어 지금은 예동(禮洞)이라고 불리는데, 이곳은 고려 희종(熙宗) 때 봉열대부(奉烈大夫)를 지낸 배현보(裵賢輔)와 공민왕(恭愍王) 때 도총제(都摠制)를 지낸 배극명이 살던 곳이라 기록되어 있다.
- 『경산지(京山志)』
- 『성산지(星山誌)』
- 『성산배씨족보(星山裵氏族譜)』
- 『성주군지』(성주군·성주문화원, 20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