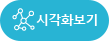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8400498 |
|---|---|
| 한자 | 性理述集 |
| 분야 | 역사/근현대,문화유산/기록 유산 |
| 유형 | 문헌/전적 |
| 지역 | 경상북도 성주군 |
| 시대 | 근대/일제 강점기 |
| 집필자 | 추제협 |
| 간행 시기/일시 | 1923년 |
|---|---|
| 소장처 | 청사 도서관 -
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청사도서관길 13[경산리 229] |
| 소장처 | 국립중앙도서관 -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[반포동 산60-1] |
| 간행처 | 회소당 -
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85
|
| 성격 | 고전적|고문헌 |
| 편자 | 서응윤(徐應潤)[1836~1862] |
| 간행자 | 서홍국(徐洪國) |
| 권책 | 8권 5책 |
| 행자 | 10행 20자 |
| 규격 | 29.8×20.0㎝ |
| 어미 | 상하내향사판화문흑어미(上下內向四瓣花紋黑魚尾) |
| 권수제 | 성리술집(性理述集) |
| 판심제 | 성리술집(性理述集) |
[정의]
성주 회소당에서 1923년에 서홍국이 간행한, 조선 후기 학자 서응윤이 성리학 용어와 관련된 글들을 발췌하여 편찬한 성리서.
[저자]
서응윤(徐應潤)[1836~1862]은 본관이 달성(達城), 자가 주성(周聖), 호가 우금(友琴)·유자(孺子)이다. 아버지는 사헌부 감찰을 지낸 서택호(徐宅鎬)[1809~1894]이다. 사서삼경(四書三經)과 제자백가(諸子百家)에 능통했고 시문에 뛰어났다. 효성이 지극하여 27세에 요절했으나 효행으로 천거되어 1869년 동몽교관(童蒙敎官)에 추증되어 정려(旌閭)가 내려졌다.
[편찬/간행 경위]
『성리술집(性理述集)』은 1923년 서응윤의 아들인 서홍국(徐洪國)이 편집하여 성주에 있는 회소당(繪素堂)에서 간행하였다.
[형태/서지]
8권 5책의 목활자본(木活字本)이다. 판식은 사주 쌍변(四周雙邊)으로, 계선이 있으며, 상하내향사판화문흑어미(上下內向四瓣花紋黑魚尾)이다. 크기는 29.8×20.0㎝, 반곽의 크기는 21.7×15.8㎝이다. 1면 10행에 1행의 자수는 20자이다. 권수제와 판심제는 ‘성리술집(性理述集)’이다. 주(註)는 쌍행(雙行)이다. 장정법은 선장본(線裝本)이고, 지질은 저지(楮紙)[닥종이]이다. 현재 청사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.
[구성/내용]
『성리술집(性理述集)』은 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. 권두에 1866년에 이원조(李源祚)가 쓴 서문과 1868년에 유주목(柳疇睦)이 쓴 서문이 있다. 권수에 총목(總目)에 이어 심성성경총설(心性誠敬總說)과 도설(圖說) 15편, 부도(附圖) 18편이 수록되어 있다. 권1에는 사천(事天), 독서(讀書), 주정(主靜), 격물치지(格物致知) 등 13개 항목이, 권2에는 사단칠정총론(四端七情總論), 성의(誠意), 극기(克己), 변의리(辨義利) 등 11개 항목이, 권3에는 경직의방(敬直義方), 존심양성(存心養性), 양호기(養浩氣), 심통성정(心統性情), 불인심(不忍心) 등 13개 항목이 실려 있다. 권4에는 천명성(天命性), 기질성(氣質性), 변심성정지의(辨心性情志意), 인심도심집중(人心道心執中), 명명덕(明明德) 등 15개 항목이, 권5에는 인성부동(人性不同), 인물지성(人物之性), 변화기질(變化氣質) 등 8개 항목이, 권6에는 성현(聖賢), 태극(太極), 천지역수(天地曆數), 리기동정(理氣動靜) 등 7개 항목이 실려 있다. 권7에는 천도일월성신운행(天道日月星辰運行), 지리산수해조(地理山水海潮), 삼재(三才) 등 4개 항목이, 권8에는 음양오행(陰陽五行), 귀신(鬼神), 변제자오설성리(辨諸子誤說性理), 변유석동이(辨儒釋同異) 등 9개 항목과 자서(自敘)가 실려 있다. 도설은 「일심성성경총설(一心性誠敬總說)」를 비롯해 「태극도(太極圖)」, 「천지방원도(天地方圓圖)」, 「일월동하구도유천선지전도(日月冬夏九道由天旋地轉圖)」, 「태허포이기신도(太虛包理氣新圖)」, 「천명성리신구도(天命性理新舊圖)」, 「인신겸인사도(人身兼人事圖)」 등과 해설로 되어 있다. 권말에는 저자의 자서와 1921년에 장석영이 쓴 발문, 1923년 성주의 회소당에서 저자의 아들인 홍국이 간행했다는 간기가 있다. 본문의 내용은 성리에 대한 항목별 선유의 글을 인용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방식을 취했다.
[의의와 평가]
『성리술집(性理述集)』은 성리학의 핵심 용어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정자와 주자 등 선유들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. 특히 이황, 송시열 등 우리나라 학자들의 글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당대 유학자들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.
- 『성주문원-성주 고서 및 문집 해제』 (성주문화원, 2007)
-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(http://encykorea.aks.ac.kr)